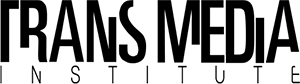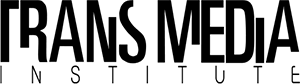[윤이상을 만나다]「윤이상을 만나다」리뷰 : 윤이상의 목소리‧음악‧시각화를 통한 현시 작업
윤이상은 그의 육성으로 한국 음악을 소개한다.
서양적인 것 속에서 음양과 도道 등 동양적인 것을 현시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윤이상을 만나다」는 윤이상의 음악, 그리고 다큐멘터리 안의 육성/목소리를 입히고(들을 수 있고), 그의 복잡한 음악을 안무로써 구체화한다. 비구조/파열의 구조, 불협화음, 음절/기표들의 장난스런 호흡, 가곡 「피리」가 지닌 복잡함의 구조, 파악/진단할 수 없음, 서스펜스/긴장적 요소들이 몸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몸은 이 안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하나의 음표/악구처럼 분절적이고 독자적으로 기능하는데, 이 몸에 대해서 음악은 여전히 과잉으로 남는다.
반면 이 음악의 복잡성을 몸은 어떻게 시각화/구체화/표현해 내는가는 그 음악에 대한 단순한 몸의 반응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 몸은 이 음악의 어느 한 부분을 부여잡는 확신(단단함)이 있다. 또는 음악의 추상화된 상징 그 자체로서 침잠하며 하나의 단자로 화하거나 내지는 구성적인 차원의 일부를 이루는 측면 역시 존재한다. 두 번째 무대에는 무대를 비추는 영상이 활용되고, 몸의 공간적 분배(악보의 편재/음표의 분배)가 카메라의 각도를 달리한 중첩된 두 화면으로 무대 전면에 투사된다. ‘대한 늬우스’에서 윤이상의 자취를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영상에서는 집들이 나오고, 위태위태함과 불안정한 안착되지 못 하는 음악들이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긴장적 요소를 상기시킨다.
두 남녀가 하나의 직선 방향으로 굴리고 굴리며 단단하게 몸을 접합시키고, 현무도와 주작도 등의 그림이 영상에 나오고, 이것들의 입체적인 움직임, 그 안에서 몸의 굴신‧신장을 활용하여 그 긴장들을 잡아끌고 빠르게 휘저으며 그 안에 침잠하고 또 드러낸다. 유동하는 몸의 균형적이고 탄탄하며 힘을 내재한 꿈틀거림과 유연성, 탄력을 전면에 내세운 춤을 조각해 낸다. 멜로디를 내는 플루트의 이따금씩 치솟는 불안한 지정과 투여, 이는 단속적이고, 또한 그 호흡이 짧아 역설적으로 주선율이 되지 않고, 이러한 몇 개의 사건적인 악기의 발생은 안온한 구조를 만드는 대신 주선율 같은 악구의 중첩들, 곧 긴장의 드리움과 거기서의 멈춤을 통한 긴장의 지속과 또한 풀어짐이 음악을 구성해 낸다.
윤이상은 동양은 서양의 구조와 구성의 음악적 특성 대신 음 하나로 조형성을 빚는다는 견해를 전하는데, 이는 하나의 음이 하나의 사건이자 이어짐이 아닌 단절과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한편 오케스트라 안 첼로를 자신으로 상정하고, 그 바깥의 오케스트라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 보는 윤이상의 생각들이 나오는데, 「윤이상을 만나다」에서 윤이상의 육성은 소위 윤이상의 재현이 아니라(영상은 생명의 복원성, 흑백 영상은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지정하며 이는 현시가 아닌 재현의 양태를 띠지만, 반면 그의 목소리 자체는 재현을 뛰어넘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귓가를 파고드는 외화면 목소리가 아닌, 무대에 덧씌우며 중첩되는, 대위법으로 다른 무대 요소인 음악과 몸에 가로 놓이는 것이다. 움직임은 직선을 유연한 손짓으로 타고 오는 반복으로 음가와 악구를 형성하며 배치와 속도의 층 차로 조형적으로 음악을 빚는다. 이 단순화한 속도로, 그 간격 배치의 다양성을 통해 무대를 하나의 음들/악보의 구조로 만든다. 윤이상의 고향 통영을 재현하는 측면에서 산과 강 사운드가 튀어 나오고, 초롱불을 든 동네 아이가 지나간다. 플루트의 불협화음과 퍼져 나감, ‘나는 조그만 어촌의 변두리 마을에서 자랐는데, 호롱불을 들고 천막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12살 때 음악을 흉내 내며 작곡을 하기도 한다’는 윤이상의 변.
이 화면에서 초롱불 날아가는 것을 입체적으로 표상하기도 하고, 이 지난날의 추억‧정서는 그 긴장감 넘치는 불협화음의 선율과 함께 신비한 시공간 대에 사로잡히게 된다. 친숙함이 아닌 그 낯섦의 시공간을 관객은 마주하게 된다. 초롱불이 여러 개로 확장/유동하며 그 자취를 남기며 천천히 사라지는 장면은 그 기억의 순간의 확장이자 침잠이고, 새롭게 기억과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그 자체로 유동하며 알 수 없는 궤적, 단지 위로 올라간다는 시간의 흐름만을 지정한 채 사라진다. 이것 자체의 안무, 그리고 유장한 강의 흐름(그 표면의 실재). 초롱불을 든 아이와 어른의 의식의 접점은 기억을 통해서만 구현된 것이지만, 무대에서 이상理想을 만나게 된다. 윤이상의 이상理想. 자신의 아버지가 조상의 묘를 일일이 가르쳤는데, 그 묘를 유일하게 자신만이 기억함에도 찾아갈 수 없는 환경은 생전의 윤이상에게는 다리를 뻗고 잘 수 없을 정도의 안타까움을 낳는다. 그리고 등장하는 윤이상의 초상, 아마도 「윤이상을 만나다」는 하나의 제식‧위무, 또 그 음악에의 침잠과 명시화 작용이기도 하다.
윤이상의 음악은 전복적이고 사건적이어서 매우 정치적인 동시에 의도적으로 양식을 파괴하는 점(양식에 대한 전복적 구조)에서 또한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공연 후반 음악의 배면에 깔린 긴장, 이것은 심연과 만나는데 그 긴장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측면이 있다. 흐름을 멈추고 중첩 층위의 레이어를 만들고 그 레이어들이 반복적으로 깔리면서 같은 효과를 내고, (반복을 통한) 망각을 통해 이 알 수 없는 심연에 다시 또 빠뜨리는 것이다.
앞선 윤이상의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이야기들과 달리 그가 노쇠했을 때, 죽기 전의 모습을 비추는 영상은 삶의 이야기‧기억의 조각들이 담기는 인터뷰로 이뤄진다. 강단진 이전 영상의 모습에서 이러한 윤이상의 모습은 음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 우리 민족의 깊이‧정신 등 문화 유전자의 총체적인 것들에 대한 강조로 또한 드러난다. 인류의 평화를 우리 민족의 소명으로 전하고(이로써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남북의 통일이 이에 대한 강력한 상징성을 띠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어떤 뭉클함도 묻어난다. 동시대가 아닌 타지에서 전하는 거장의 목소리.
[공연 개요]
– 제목 : 「윤이상을 만나다」
– 공연일시 : 9월30일(금) ~ 10월1일(토), 금요일 8:00pm / 토 3:00pm, 7:00pm
– 공연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관 람 료 :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제 작 : 아지드 현대무용단 (대표 정의숙)
– 안무 – 정의숙 / 연출 – 변 혁
김민관 기자 mikwa@naver.com
Date
2013년 9월 2일